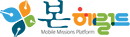최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가 비만일 확률이 일반 가정에 비해 높다고 한다. 저소득층에 과체중 영유아의 비중이 컸는데,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못하고 있어서이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는 많은 반면, 비타민A, 비타민C, 나이아신(비타민B3) 같은 중요 영양소의 섭취는 기준치에 못 미쳤다.
영유아 시절의 건강과 영양 정도가 성인이 된 뒤까지 영향을 미쳐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적 보장이 시급하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멀기만 하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저소득층의 영양 섭취를 돕는 사업이 임·출산부와 영유아에게 쌀, 감자, 달걀 등 보충 식품을 공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고작이다.

음식정의(Food Justice)란 말이 있다. 유기농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가격 때문에 그냥 싼 가격의 음식을 선택해서 먹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한 방송사가 보도를 통해 ‘고도비만은 가난을 먹고 자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린 시절 가난하여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이 없으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인스턴트식품을 과하게 먹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영양도 불균형해지는 데다 가난이 주는 무력감이 고도비만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이야기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비만이 곧 그 사람의 경제력을 가늠’할 만큼 음식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시하기엔 갈수록 현실이 심각해져가고 있다. ‘못 먹어’ 죽는 이들보다 '잘 못 먹어' 죽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먹으려 해도’, ‘잘 먹으려 해도’ 경제력이 안 되거나 삶이 분주해 끼니를 때우듯 식사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어린 세대일 경우 마음이 더 아프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영유아들은 과자, 사탕, 초콜릿을 먹는 비율이 20.2%이고, 고소득(월 261원 이상) 가정의 영유아의 12.8%보다 크게 높다.
세상 모든 사람, 특히 자라나는 세대는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음식은 인간답게 살 권리에 있어 최우선의 조건이다.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한으로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일찍부터 고민하며 실천한 이들이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지역의 피플즈 그로서리(People's grocery)이다. 값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가공식품으로 한 끼를 때워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도, 비싸서 채소를 사먹지 못하던 이들에게 유기농 채소를 싼 가격에 공급하였다. 시에서 빌린 땅에 유기농 채소 씨앗을 뿌려 재배하여 가능한 일이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도시농업이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다. 도심 속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누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바라건대 이러한 실천이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빈부를 떠나 공정한 밥상을 차리는 일로도 이어지게 되길 기도한다.
- 유미호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