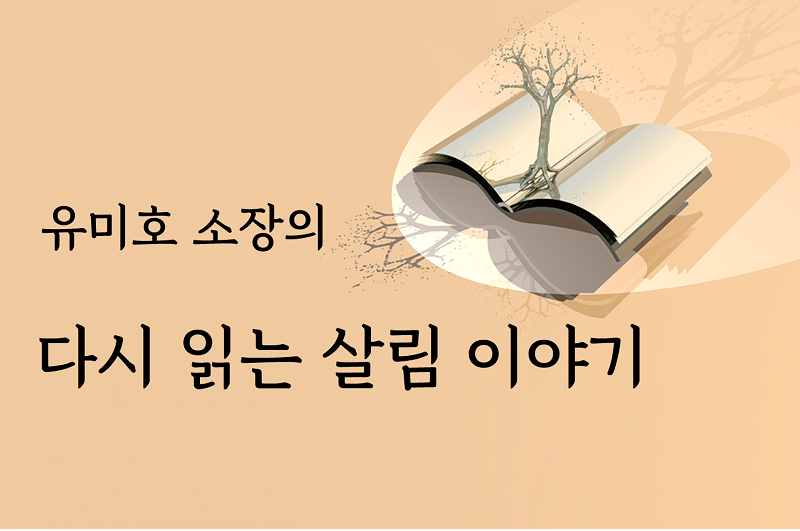

지난 7월 미국 국립암연구는 ‘미국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을 평균보다 많이 섭취한 성인의 평균 사망률이 전체 대상자보다 낮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연구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 식단이 장수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보고했으며, 지난 2019년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서도 고기보다 콩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살수 있다고 했다. 콩은 인류의 오랜 건강식품이었다.
우선 콩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보면, 콩은 채식 위주의 농경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우리나라에만도 콩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이 발달되어 있다. 떡에 넣고, 된장과 간장을 만들고, 두부를 만들고, 콩나물로 키워 먹으며 콩으로 만든 제품을 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여러 작물 중 올해 콩 작물을 선택한 것은 콩이 가뭄에 강하고 영양학적으로 중요해서다. 콩은 ‘밭에서 나는 단백질’로 주요 아미노산이 많을 뿐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의 원천이기도 하다.
콩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자랄 때 질소를 고정하는 특성이 있어 흙을 비옥하게 해준다. 그래서 콩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영양가 높은 곡물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콩을 재배하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 수확량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인구는 점점 늘어나 2050년이면 100억 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야 그때가 되면 먹을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다 절대 부족 상태가 될 것이기는 합니다. FEW(Food, Energy, Water)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식용 콩 자급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사료용까지 포함하면 10%에도 못 미친다. 자칫하다가는 재배한 지 200년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세계 제 1위의 콩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된 미국에서 수입하는 값싼 콩에 밀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미국이 생산하는 대두의 90%가 아시아에서 채집된 종자고, 그 가운데 6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채집된 걸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아직도 ‘자동차나 핸드폰 팔아 콩 사먹을 생각’만 하고 콩 심을 땅 한 평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십만 톤의 콩은 곧바로 시중에서 판매되기보다 두부나 된장이며 간장, 식용유와 스낵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데, 그 대부분이 유전자조작된 것이어서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의 원재료 70%가 수입산이고 그것의 80% 이상이 GMO(Genetically-modified Organism)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GMO식품 세상이다. 그래서 국산 콩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수입 콩과 국산 콩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오늘도 밥상에 콩을 올리자니, 먼저 한 숨이 난다. 땅을 비옥하게 하면서 자라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콩’ 이야기를 환히 웃으며 밥상에 담아내고 싶지만, 날마다 재배할 땅은 줄고 그 가치는 떨어지고 값싼 수입 콩만 물밀 듯 들어오고 있으니 그저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이다. ‘콩의 해’를 맞아, 누구나 새해에도 ‘콩’과 콩을 키우는 이 ‘땅’에 희망 이야기를 들려주는 밥상을 차리게 되길 기도한다.
- 유미호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