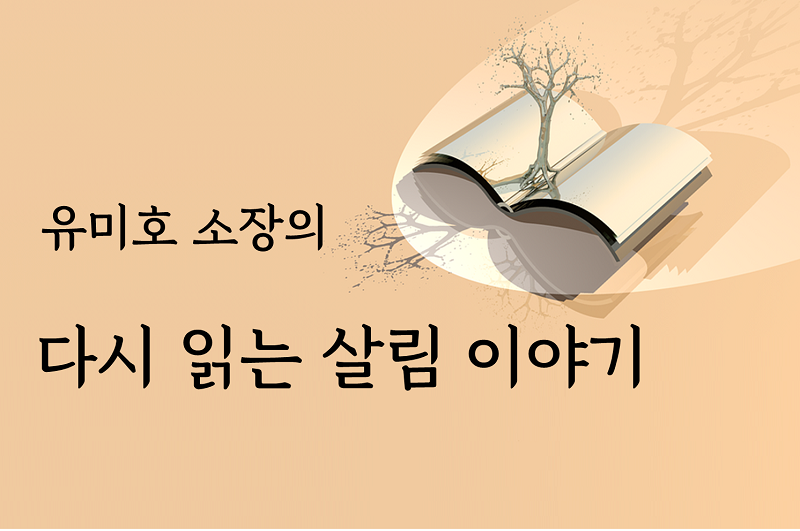
“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7:19)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고 베갯잇에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곡식이나 채소 따위의 씨앗은 수분, 온도, 산소의 조건이 적당해지면 새싹이 나고 자라서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랜 세월을 거친 씨앗들은 자라난 식물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우리 조상들은 여러 씨앗을 물려주어왔다. 콩은 자그마치 4천여 가지가 넘었고, 벼는 2천여 가지나 되었다. 농부들은 씨앗을 심고 키워서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심은 것 이상 불려서 물려주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종자를 전하는 일이 농부가 아닌 종자은행이나 종묘회사의 몫이 되었다. 씨앗은 다양성을 잃게 되었고 어떤 종은 사라질 위험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우수 품종 하나만 심었다가 역병(감자마름병)으로 인해 수확이 안 되어 수백만 명이 죽은’ 사건과 ‘안데스 산맥 고산족이 힘들어도 지금껏 28가지의 감자를 심어먹고 있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안타까운 건 요즘 농사가 단작에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량을 늘린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로 사람은 배부르게 먹지만 씨앗은 다양성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최근엔 유전자조작 특허로 수천 년 이어져온 농부들의 씨앗 재사용을 막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GMO종자를 개발하여 상품화하면서 벌이는 일이다. 그 종자는 ‘제초제와 종자가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제초제 저항성 종자’와 ‘병해충 저항성 종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개발보급자가 말하는 확대 이유는 ‘식량 공급의 안정성’과 ‘식품의 안정성’이다. 하지만 조금만 살피면 다국적 종자회사가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종자 판매 독점, GMO종자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 정경유착을 통한 특정작물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만 봐도 그렇다.
GMO종자가 세계 식량난의 해결은커녕 식량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GMO종자회사가 옥수수와 콩을 사료용으로 대량 생산한 것은 축산의 지방산 불균형은 물론 항생제의 다량 사용을 낳았고, 이는 또 인류의 비만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식품 안정성의 경우는 평생 먹는 식량을 겨우 90일 간의 검사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옥수수와 콩 사료로 하는 축산이 인류의 비만 촉진과 축산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GMO종자로 짓는 농사는 토양을 파괴하고 작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미국 농무성에서 32년 동안 근무한 과학자의 양심고백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GM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은 상업화된 이후로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경작 면적의 50%나 되는데, 전체 재배면적 대비로 보면, 콩 82%, 옥수수 30%, 목화 68%, 카놀라 25%이다. 주요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가면 그 수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식용으로 GM작물이 재배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농업진흥청이 GM작물개발사업단을 만들어 GM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이미 시험재배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산업용 벼’라고는 하지만 심사가 마무리되어 재배가 시작되면 토종 벼들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이고 식품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수입된 것의 많은 양이 GM작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콩, 옥수수의 경우 80%, 92%가 GMO로 전 세계 1위의 식용GMO 수입국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 땅에서 토종씨앗 운동이 부활하고 있다. 토종씨앗 운동은 오랜 동안 이어져온 씨앗이 이후로도 계속 흙을 만나게 하여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곡식과 채소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돕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새 봄을 준비해야 하는 길고 긴 겨울.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씨앗이 흙을 만나 새싹이 되고 열매가 되어 미래를 활짝 열어가게 해보면 좋겠다.
- 유미호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