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일찌기 "국민은 언제나 옳다 "라는 말은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브리튼(William Ewart Gladstone 1809 – 1898 )에 의해 유명해진 말이다. 그는 1866년 영국 하원에서 의회 연설 중에 "국민은 언제나 옳다( The people are always right.)"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국민의 의견과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했다. 실로 이 말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중요시하는 핵심적인 원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역사적으로 “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라는 이 말이 정말 옳은 것으로 증명되어 왔는가? 아쉽게도 그렇지만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인해 반영된 결정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물의와 비극을 초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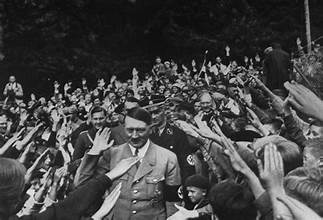
가장 비극적인 국민의 결정 중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 Adolf Hitler 1889 – 1945)의 지도력 아래 극렬한 반유대주의와 독재주의를 고수하며 극우 성향의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나치당(NSDAP)을 1932년 7월의 총선거에서 37.3%의 득표율로 밀어주어 당시의 최대 정당으로 만든 결정이었다.
결국 나치당은 독일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여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므로 독일의 독재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히틀러와 나치당의 지배 아래 진행된 학살과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참상은 모든 인류에게 막대한 비극을 초래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멀리가지 않아도 2016년에 영국의 EU 이탈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열렸고, 영국 국민의 51.9%가 EU를 탈퇴하는 쪽에 투표했다. 이 결정은 영국과 EU 간의 복잡한 관계와 국내 정치적 분열을 야기했다. 브렉시트 과정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영국 경제와 정치에 지금도 많은 악영향을 끼쳐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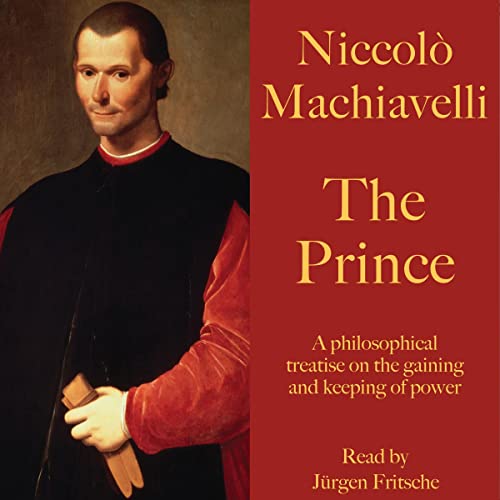
베네수엘라 역시 국민들은 무능한 정치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Nicolás Maduro Moros 1962- )를 2013년 대선에서 당선시킨 후 과도한 경제 정책, 부패,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나라전체가 심각한 위기와 혼란에 빠져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죄를 찿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자에 못박으라는 당시 대다수 민중인 유대인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어 빌라도 총독이 수용하므로 보여준 가장 극명한 다수결의 모순이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 는 민주주의적 정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적색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Until the redness disappears, we must fight for a better future.)고 말했다. 이것은 다수의 의견이나 투표 결과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부정하고 악한 것은 사라질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정의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면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말에 상당한 회의와 함께 착잡한 감정을 감추기 어렵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정당한 편에 서려는 최소한의 국민양심이 아니라 한 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에 대한 고집과 선입견을 가진채 대립된 정당의 한 편으로 무조건 내편이 이겨야 한다는 우리진영주의 또는 우리편주의 ( partisan bias or tribalism )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각당 모두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끄집어내어 심판하고자만 대드는 막장 정치현실은 국민들을 자기들 정당의 패싸움의 제물로 삼아 제2의 남북을 만들고 새로운 3.8선을 긋는 반민족적인 파렴치한 행위와 다름없게 보인다.
미국 헌법 및 미국 형법 분야의 연구로 유명한 미국 법학자 더셔비츠는( Alan Dershowitz 1938)는 민주주의 정치의 맹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때로는 소수의 권리나 이익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는 투표자의 무지와 선동에 의한 악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투표자의 무지와 선동에 의한 영향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들이 정확하고 평가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진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이런 다수결의 맹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앉아있다는 느낌은 나만의 느낌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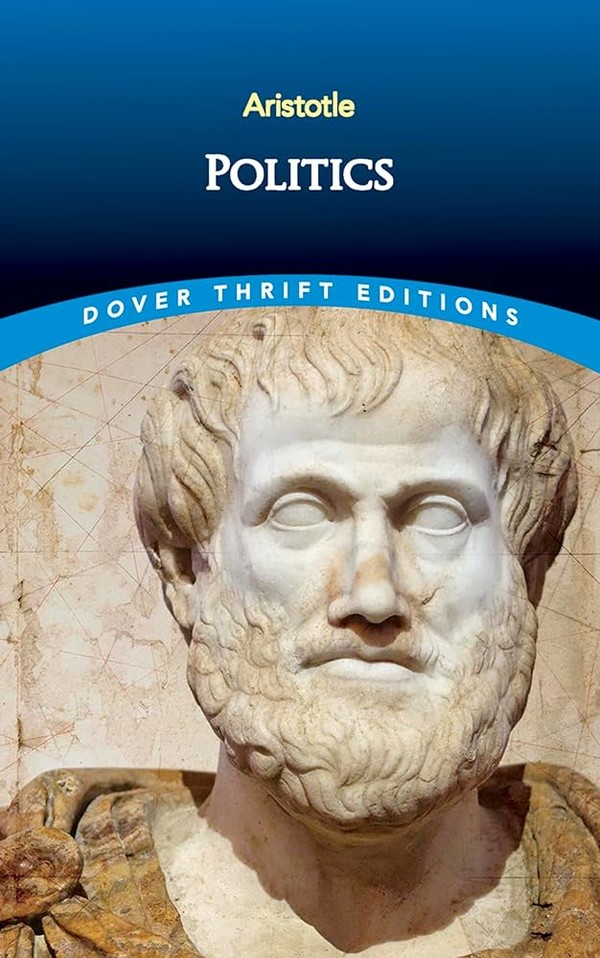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 384–322 BC)는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cs)에서 정치 체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는 집단의 탐욕과 판단력의 결핍으로 인해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지금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런 횡포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때는 정말 국가를 안정시키고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군주의 결단력과 통치에 있다고 강조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의 '군주론'이 이해가 된다. 1513년, 이 책을 쓸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 불안과 무질서를 겪고 있던 시기였고 분열된 작은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외부의 강대국들의 침략과 내부적인 무질서로 혼란했던 시기였다. 때문에 이탈리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그는 군주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때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군주가 민중의 의견을 무시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군주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에는 존재할 수 없으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현실에 이런 군주적 결단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모세가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의 바로 학정에서 이스라엘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의 지도력과 지도자의 고뇌와 고독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바로와 같은 권력의 칼에는 한없이 약하고 무력한 민중, 그러나 자신들의 불이익이나 어려움에는 언제나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며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쏱아내는 백성을 이끌고 목적지까지 가야하는 그 험난한 여정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사명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인내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때면 그들을 깨우치고 이해시키고 교정해 나가며 끝내 목적지 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 대한민국에 그런 선하고 바르며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엘리엇( T.S Eliot )의 황무지 ( The Waste Land )가 그렸던 시, 잔인한 4월을 떠울리며 마당 앞에 핀 또 다른 4월, 하얀 벚꽃의 순수한 눈부심에 깊은 숨을 내쉬어 본다.
2024년 4월
이삭 목사
Azusa Pacific Univ.
Calvin Theological Sem.
yeesaak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