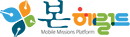나는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백한 내용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는 말씀이 있다.
아버지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다. 목이 쇠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면 날계란을 드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곤 했다. 낮 시간에는 직접 만드신 괘도를 걸어 놓으시고 재림론을 강의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셨다. 그런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내가 목사가 되었고 영광의 릴레이 주자로 바통까지 받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그 바통을 아들에게 주었으니 더욱 영광이고 감사하다.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만 있다면 이 강단에서 쓰러져 죽는다 해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게 나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종으로 계속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는 것이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여수에서 목회하는 육 목사님과 어느 날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목사님은 피종진 목사님보다도 먼저 부흥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날 피종진 목사님은 크게 쓰임을 받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피 목사님께서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한 우물을 판 것이고, 셋째는 무릎을 꿇는 부흥사라고 하였다. 그 순간 이 말씀이 화살과 같이 내 가슴에 강하게 박히면서 나를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 어느덧 나도 담임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는 부흥 목사로 오래도록 쓰임 받고 싶다. 롱런하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나의 소망이고 끝가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