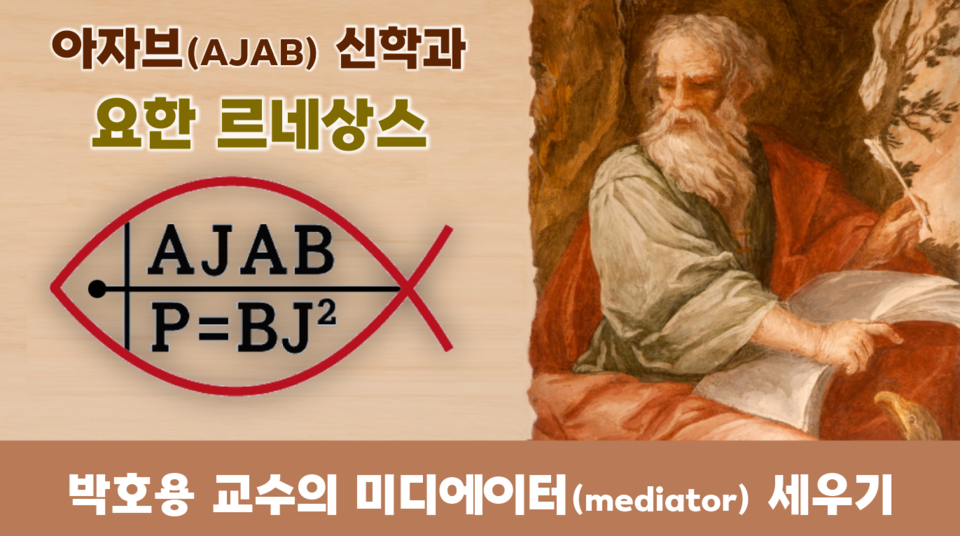
1.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예수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가 다를 때 그들의 세계관(사고방식)과 함께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한 가지 구체적 실례로서 구약 예언자 가운데 호세아와 아모스의 메시지 차이를 ‘삶의 자리’의 차이를 통해 살펴보자.
주전 8세기 예언자인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같은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호세아는 토종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자기 나라에서 예언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지점에 위치한 드고아 출신이다. 즉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시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북왕국에 가서 예언활동을 하였다.
같은 북왕국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출신이 다르기에 이들의 메시지는 달랐다. 즉 호세아는 모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머니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인애, 호 2:19; 4:1; 6:4,6; 10:12; 12:6)를 전한 ‘사랑의 예언자’였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 출신인 아모스는 타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버지의 머리로 하나님의 공의인 ‘미슈파트’(정의, 암 5:24)를 외친 ‘정의의 예언자’였다. 이를 다른 말로 비유하면 똑같이 일본 선교를 하지만 일본인이 일본 선교하는 것과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수와 바울이 삶의 자리가 다르다고 할 때 유대인 예수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한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서 철저히 히브리적 사고를 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학문을 한 도시 출신의 학자로서 헬라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히브리적 삶의 배경인 예수님과
헬라적 삶의 배경인 바울
2. 헤브라이즘을 탄생시킨 히브리인과 헬레니즘을 탄생시킨 헬라인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헬라적 사고는 명사(名詞) 위에 세워졌고, 논리적이고 본질(essence)에 집중한다.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는 동사(動詞) 위에 세워졌고, 역리적이고 행동(action)에 집중한다. 헬라적 사고는 정리(定理) A가 참이면, 그 반대 명제인 B는 반드시 거짓이다. 따라서 이 두 명제(A와 B)는 이원론적 특성을 지닌다(양손에 비유). 이에 반해 히브리적 사고는 A가 참이면, 그 반대 명제인 B는 반드시 거짓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일원론적 특성을 지닌다(한 손의 양면에 비유). 가령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헬라적 사고에 의하면 예수님이 신이면 인간이 아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면 신이 아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일 수 있다.
이를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명제에 적용시켜 보자. 헬라적 사고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반대 명제인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명제는 거짓이다. 루터가 ‘sola fide’, 즉 ‘믿음으로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을 그가 신학화한 것이다. 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8).
이방인의 사도(행 9:15)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말하고자 한 취지는 “의롭게 된다”(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법(코셔법)과 같은 다양한 율법을 지킴(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십자가와 부활)를 통해 의롭게 해주신 것을 단지 믿으면 의롭게 된다(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있다. 이는 그 다음 구절(롬 3:29)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행위)을 이방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바울의 의도이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루터는 바울의 이 같은 언급을 참과 거짓의 이항대립적 사고방식인 헬라적 사고로 해석하여 ‘sola fide’, 즉 ‘믿음으로만’으로 해석하였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여기서도 바울의 진정한 의도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율법들(안식일, 할례, 음식법 등)을 행해야지만 의롭게 된다(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까닭은 몇 절 아래에 있는 구절에서 잘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21).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무용지물)이 되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서양인 루터는 그 시대적 상황, 즉 중세 가톨릭이 다양한 행위(면죄부 사는 행위 또는 선행이나 고해성사 등)를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연히 ‘믿음으로만’이라는 ‘sola fide’를 역설하게 되었고, 결국 ‘행함이 배제된 믿음’(헬라적 사고방식)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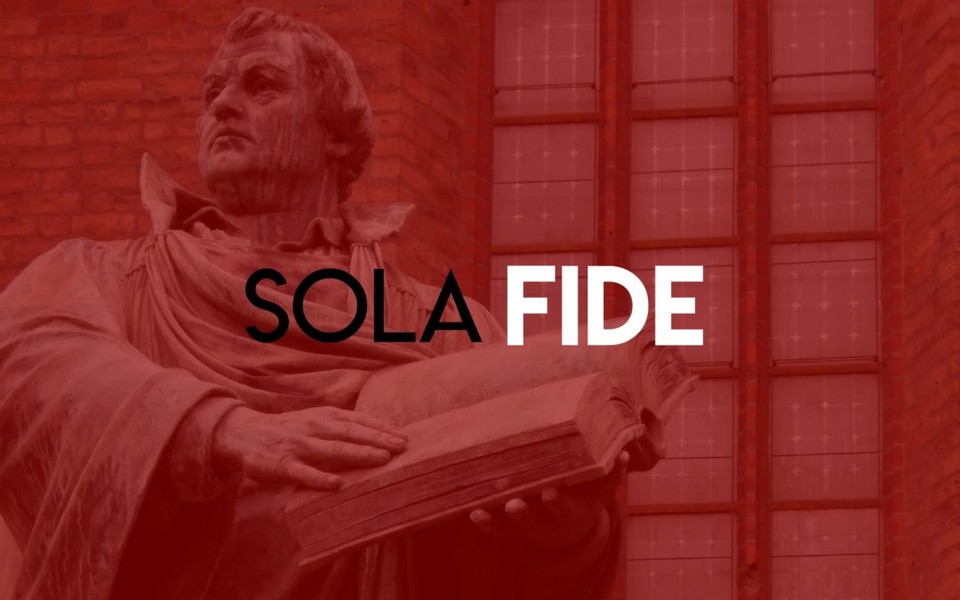
3. 바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이라는 바울의 어법은 곧 초대교회 안에서조차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급기야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 2:17)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루터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이라는 바울의 어법에 기초하여 ‘sola fide’를 외치며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다. 이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갖는 문제성을 인식한 칼뱅(J. Calvin, 1506-1564)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justification)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뒤따르는 성화(sanctification)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나아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500년 동안 이어져 온 ‘믿음으로만’ 구호는 바울이나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신앙의 본령인 히브리적 신앙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한다. 헬라어가 명사 중심의 언어라면,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이다. 히브리적 신앙은 기본적으로 역동적(dynamic) 신앙이다. 동사(행위) 위에 기초한 신앙이다. 우리는 “학교에 간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 “간다. 학교에” 순으로 말한다. 즉 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그 유명한 쉐마 본문의 첫 대목, “이스라엘아, 들으라”(신 6:4)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이다. 동사가 먼저 나온다.
행동 중심의 역동적 신앙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지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 10:25-37)에서 유대인 학자인 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이웃에 대한 ‘개념적 정의’(헬라적 사고)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하는 행동’(히브리적 사고)이 중요함을 역설하셨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으로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눅 10:34).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한마디로 히브리적 신앙은 행함이 있는 역동적(실천적) 신앙이지, 단지 믿음으로 만의 개념적(관념적) 신앙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진 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고 명령했을 때 “네 믿습니다”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인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고 명령했을 때 “네 믿습니다”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성취되었다.
행함이 있는 역동적 신앙
히브리적 신앙
정리하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 일원론적 히브리 신앙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칭의) 사람은 의로운 삶을(성화) 살아야 한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이원론적 명제 위에 세워진 헬라적 사고에 의하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역설함으로 믿음(칭의)과 삶(성화)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믿음 따로, 삶(생활) 따로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 참된 신앙이란 믿음과 행함(삶)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일치된 것을 말한다.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생활신앙’이 참 신앙생활이다. 오늘 바울이나 루터보다 더욱 히브리적 사고(신앙)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패러다임의 변환이 요청되는 까닭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다(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