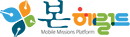영광의 날이 저문다. 기세 좋던 한낮의 도약과 비상이 희미한 기억 저편에 걸려 있다. 여전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건만 새해의 첫 아침맞이는 바로 어제와 다른 느낌이다. 1월과 2월을 보내고 맞았듯 8월과 9월을 그렇게 보내고 맞으면서 올해도 세월의 저 강을 건너리라! 세월은 마치 거친 질감의 옷을 덧입는 것 같아 마음이 약간 무거워진다. 이 무게감은 벗어버릴 짐이 아니라 피부처럼 벗을 수 없는 책무 같다. 이 무게감이 삶을 지탱시킨다.
오뚜기는 아무리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게 중심을 잡으면 웬만해서 삶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으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상투적이라 해도 이것밖에 해법이 없다. 순히 따르면 유익이 크다. 기도와 말씀의 적정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르기에 은혜의 깊이가 다르고 역사의 크기가 같지 않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출력은 입력한 만큼이다. 축적된 만큼 활용 가능하지 않겠는가!. 변수는 없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니 별다른 감회가 있을 리 없다. 마음의 변화보다 두드러진 것은 신체의 변화이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육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의욕은 여전하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청춘의 기운에 맞춰 나가기가 수월치 않다. 분신 같던 동료가 무대 뒤로 사라짐도 견디기 힘든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야 나이가 장애일 것은 없지만 예전 같지 않음은 분명하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몰입함만은 시간을 거스른다.
믿을만한 사람이 갈수록 줄어듦은 유쾌한 경험이 아니다. 배신이나 배은망덕을 읊지 않음은 그나마 좋았던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함이다. 달갑지 않은 인용이지만 적절하니 또 언급한다. 주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 사람 속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의 속에서 나와 더럽히는 7악의 정체가 뭔지 알지 않는가! 험한 꼴 보지 않고 사는 이도 있지만 의외로 배신의 늪지대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많다.
그들의 경건을 위한 훈련을 비웃지 않는다. 성공의 외투를 걸치고 험난한 사역의 길을 무난하게 지나가는 행운도 시샘하지 않는다. 그들의 신명나는 광대놀이에 재를 뿌릴 생각도 없다.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믿을 아군은 더욱 아니다. 적도 아군도 아니라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참으로 알쏭달쏭한 인간존재다.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듯 자위하는 모양새가 섬뜩함을 더한다. 문득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자못 궁금하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정죄키 위함도, 자신을 미화키 위함도 아니다. 주경야도의 삶에 익숙해가는 이 시점에서도 기억되니 자괴감을 떨쳐버리고자 부끄러움을 아프게 토해낸다.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다. 지근거리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벗들이다. 한 마음을 고백해도 한 마음 되지 않았음을 서로가 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석양 노을을 두 팔로 안고서 벗들을 지나 벗을 찾아, 벗 속의 벗을 보려 믿을만한 한 사람 되고자 방랑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