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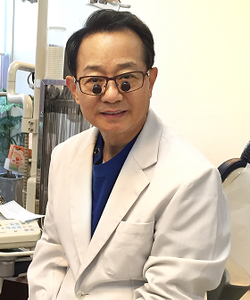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두 달간의 격리가 완화된 한강공원이다. 따스한 햇볕, 영산홍이 붉게 물들고, 풀밭 위에 신이 난 강아지가 뛰논다. 어린이의 웃음소리는 햇볕 사이로 퍼지고, 유모차와 애견, 함께 하는 가족들이다. 줄지어 가는 자전거. 4월 마지막 주에 한강의 소묘다.
오랜만에 강변 산책길을 걷는다. 어느덧 갈대밭에 왔다. 지난주만 해도 넓은 갈대밭은 다 잘리고 두어 평 되는 소수의 갈대 무리만 남아 있었다. 이제 두어 평 갈대밭마저 제초기로 잘렸는지 그냥 넓디넓은 들판이 되어 있다. 허허벌판, 비스듬히 흔들리며 늦봄까지 살아남은 역전 노장, 갈대 무리가 사라진 것이다.
문득, 나뒹군 갈대의 파편 사이에 파릇한 것이 보인다. 조그맣게 손을 내민 어린싹이다. 절망 속에서 살아난 것인지 아직 여린 손. 푸릇한 하나의 생명이다.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갈대 무리는 겨우내 그렇게 흔들린 것일까. 아니 버텨온 것일까. 먹먹해진 갈대를 주어 들자 손끝을 타고 오는 그 가벼움, 낭창거림이 전해진다. 몇 걸음 걸었음에도 바람이 이는지 손안에서 공명이 인다. 기병의 칼처럼 바람을 가르는 소리, 아니 낮게 부르는 노래처럼 말이다. 언젠가 미국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낡은 군복에 황금빛 훈장을 달고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베테랑을 본 적이 있다, 햇빛 그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이고 눈가에 잔주름. 갈대에서 삶의 흔적이 묻어난 베테랑을 떠올리는 것은 웬일일까. 바라보는 강물은 은빛 물결에 오늘따라 더 반짝거린다.
잠깐의 상념을 깨우는 소리. 자전거들이 지나간다. 아직은 바람이 차가운데 형형색색의 옷들로 자전거의 힘찬 군무를 본다. 문득, 어릴 때 가족들이 뚝섬에 물놀이간 기억이 난다. 뚝섬의 물은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놀잇배가 몇 척 떠 있는 시민들의 휴양지였다. 개발되지 않은 1960년대의 뚝섬은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홍수가 났다. 여름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양수리가 생각난다. 지금은 양수라고 하는데 그때는 일명 파리낚시라고 하는 견지낚시를 하기에 제격이었다. 그 때 양수리 철교 밑은 무릎만큼 깊었고 물소리를 내며 흐르는 넓은 개울이었다. 미끄러운 자갈로 된 바닥에 넘어져 웃기도 하며, 시원한 물속에서 낚시 채를 채며 피라미를 잡은 기억이 난다. 양수리 철교는 지금은 자전거와 산책로가 되어 있고, 그 아래로 깊은 물이 흐른다. 그 당시 지금의 한강을 상상이라도 했을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으면 세월은 참 유수와 같다.
가난한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었다. 미국의 무용수 이사도라 덩컨은 예술을 정의할 때 ‘인간을 춤추게 하는 것은 정신과 영혼이지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라의 운명과 경영,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열심히 꿈꾸고 일했다.

‘너희는 강가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왕궁의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강가에 나온 무리에게 묻는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나는 무엇을 보러 나왔을까. 천인천색의 사람들은 강가에서 만 가지 꿈을 꾼다. 가족의 꿈을 꾸며, 나라를 꿈꾸는 한강에서 말이다.
한강, 꿈꾸는 강이다. 가난한 나라가 이처럼 발전했으니 앞으로도 희망이 있을 터이다. 아름다운 삼천리 반도 강산을 꿈꾸며 천국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꿈. 그 옛날 황포돗대를 타고 다녔을 선조들의 꿈을 본다. 천인천색의 꿈을 꾸는 한강은 오늘도 유유히 흐른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