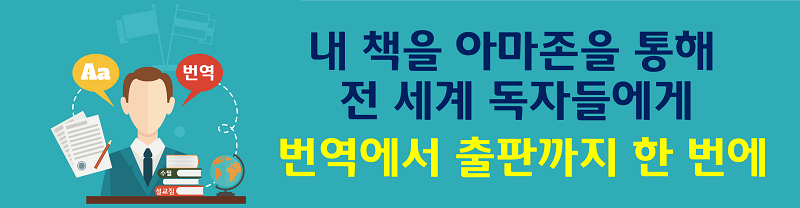전염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성대로 살고, 가치관이 부딪칠 때는 서로 인정하고 타협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가치관을 고집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교양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전염의 시대엔 집단의 일원이란 걸 깨닫는다. 한명 한명이 감염 가능자다. 자신을 지켜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른바 연대감이다.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는 이탈리아의 지성 Paolo Giordano가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쓴 화제의 책이다.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서로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다. 성경은 두 가지 면을 강조한다. ‘복을 받기 위해 지켜라’고 말씀한다. 또한 ‘행복한 자이기에 지키라’고 말씀한다. 뉘앙스가 다르다. 강조점이 다르다.
한국 사회의 선진성과 우수성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왔다. 객관적으로는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좋은 상황에 있다. ‘2020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왜 한국인은 객관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복과 거리를 두고 사는 걸까.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 82.4세인 장수국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33%에 불과하다. 기대 수명 78.6세인 미국인은 88%, 81.9세인 캐나다인도 88%가 자신의 건강에 만족한다. 의학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은 면역 기능이 높아 질병 대처 능력이 우수하다. 독감 접종 후 항체 형성률은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0%나 높다. 세상 방식과 성경의 이해 방식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사람이 행복이든 저주든 구할 수 있다.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심판하신다.
1.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의 증인임을 부각시킨다. 그 계시가 듣는 자들에게 전달된 예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칠복 중 첫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선언이다. 여섯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이미 듣는 복, 심지어 보는 복을 누린 상태다. 지켜야 복이 있다는 것보다 이미 계시를 통하여 복을 받았으니 지키라고 말씀한다.
환상을 보고 듣는 복을 받은 자의 삶의 양식이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권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과 연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언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 예언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핵심 주제다. 요한계시록에 10회 걸쳐 발견된다. 예언은 영감을 받은 사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메시지다. 예언은 읽혀지고 들려진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묵시 문헌이 아니다. 예언적 묵시 문헌이다. 신적 실재를 기초로 독자들에게 책임을 촉구하는데 있다. 예언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예언은 기상청 예보와 다르며 예측과 다르다.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온다.” 날씨 예측의 임무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기상청을 향한 분노가 만들어낸 촌철살인이다. “예보가 아니라 중계”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예언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은 예언이 단순한 예보(prediction)가 아니다. 참된 예언의 척도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불러일으키느냐 아니면 거짓 예배와 비도덕적인 행위를 장려하느냐에 있다. 요한은 자신의 글을 구약의 선지자와 동등한 예언서로 인식했다. 모든 독자들이 순종할 만한 권위가 있는 글로 인식했다. 예언은 지켜야 한다. 예언이 다 성취될 때까지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인내다. 인내에 대한 윤리적 기본 원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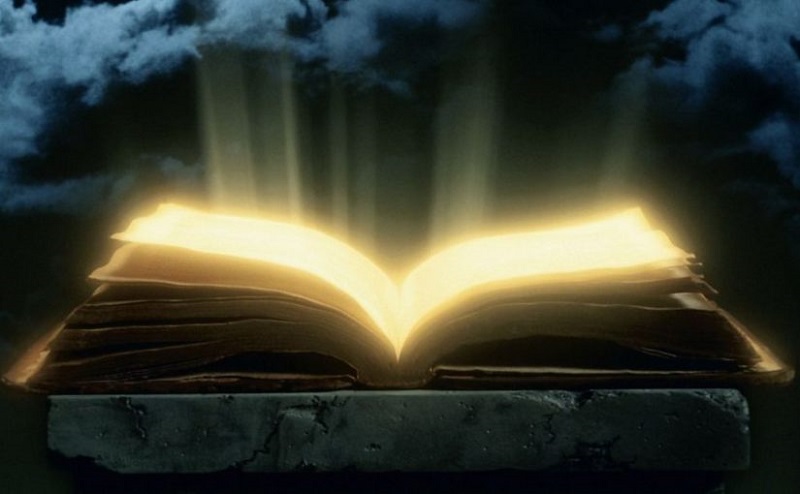
예언은 한 치의 실수도 불발탄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까닭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충실하라는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눅 11:28).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본문들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의 메시지가 용인된 예언의 전승 내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이 본문들로부터 빌려 온 언어를 사용한다.
서론은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선언한다. 결론은 이제 그 계시를 지키지 않는 자, 즉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한 저주를 발한다.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함께 묶여 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른다. 요한복음에서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결합되어 나온다(요 12:47; 14:23-24). 예언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다. 예언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2. 복 되도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
‘복 되도다’를 뜻하는 마카리즘은 유대의 묵시 문학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탁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씩 따로 발견된다. 팔복은 연속하여 발견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즉 그리스도교 예배 의식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자는 복이 있다. 2세기에 읽는 자는 교회 직원이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법을 배우면 순종하는 삶이 된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의 라틴어 단어 ‘audire’에서 왔다. 순종하다를 뜻하는 obey는 라틴어 obedire가 어원이다. ob(~에)와 audire(귀 기울이다, 듣다)가 합쳐진 단어다. ‘듣다’에 해당하는 ‘שמע’(솨마)는 동시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결합되어 나온다. 두 개념은 성경적으로 불가분의 개념이다.
동의보감에서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補)가 낫다’라고 했다. 즉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기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계 1:3). 이러한 복은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요한의 증언의 목표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강조한 첫째 복과 일치한다. 윤리적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 예언에 비추어 인내하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도록 권면한다. 그렇게 산 것에 대하여 장래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카리즘이 독특한 이유는 모두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형식이다. 전달 과정 자체에 대한 복을 제시하고 있다. 칠복 중에 네 개는 3인칭 복수 형식으로 나타난다. 세 개는 3인칭 단수다. 요한계시록 16:15에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와 20: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의 복 있는 자는 둘 다 단수다.
서론에서 복의 선언은 공중 예배다. 결론에서 복의 선언은 개인의 일상이다. 개인적인 책임을 요청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보응하신다. 보상도 개인적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으로 ‘유지되다’라는 예언의 언어들을 제시한다. 공중 예배에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도 복되고, 말씀을 듣는 회중도 복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새기는 자, 즉 지키겠다고 하는 자도 복이 있다. 이제 예배 후 일상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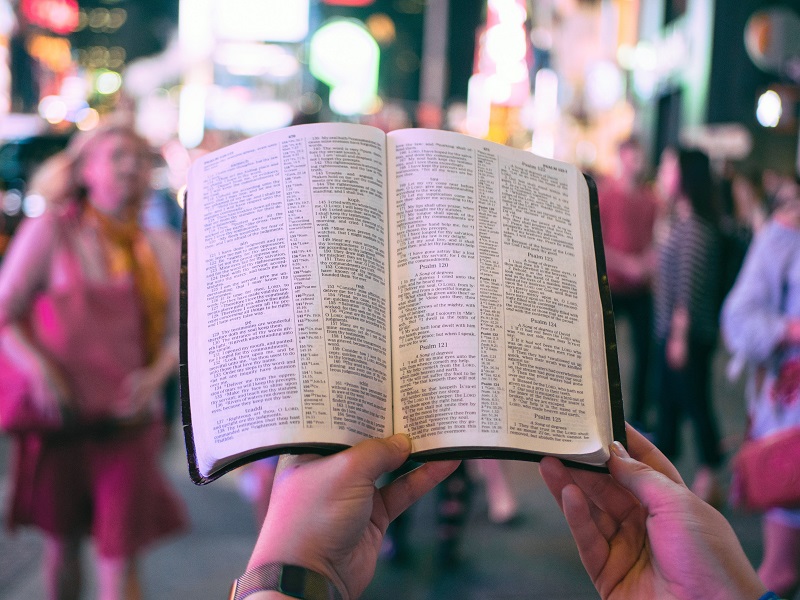
코로나19로 뜻밖의 비상사태가 오래 간다. 비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New Normal’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행복자인가. 시편 1:2에서 노래하는 ‘복이 있는 자’는 일상에서 복이다. 행복자는 일상에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일상에서 말씀을 항상 지키는 자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이다(시 1:3).
‘복되도다’라는 마카리즘(makaris)은 네로가 그리스에서 돌아왔을 때 로마인들이 그에게 보낸 환호와 매우 유사하다. “당신의 말을 듣는 자가 복 있도다”. 네로는 신으로 환영된다. ‘복이 있으리라’에 해당하는 ‘makavrio"’(마카리오스)는 일곱 번의 진술 중의 여섯 번째다. 지복(beatitute) 또는 마카리즘을 담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카리오스는 팔복에 나오는 복들과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마 5:1-12; 눅 6:20-23). 보상(rewards)과 표준(standards)이 함께 나타나 있다. 전자는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 후자는 하나님이 정한 표준이다.
한쪽만 보는 외눈박이 주장을 하면서 양쪽을 다 보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키클롭스(Cyclops) 콤플렉스’다. 편향된 시각으로 다양성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복 있는 사람’(시 1:1a), 또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이라는 표준은 정체성의 다른 말이다.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정한 표준이다. 약속과 보상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한다. 인내와 순교가 따른다. 복을 받은 자로서 지켜야 한다. 특권이다. 당당함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