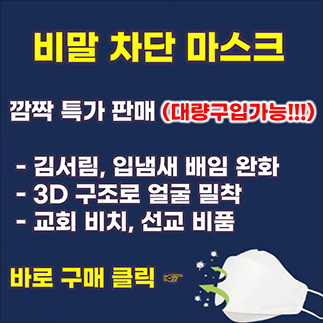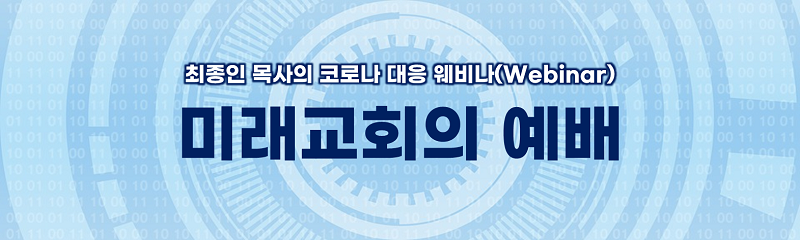

우리는 다양한 정보 매체들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루라도 휴대전화를 놓치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아침에 일어나 기상정보와 간밤의 뉴스를 검색하고, 출근길의 교통정보를 확인한다. 출근하면서 주식정보를 보며, 환율을 확인한다. 일터에서도 휴대전화가 일상이 되었다. 우스운 말로 “아내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휴대폰 없으면 정말 불편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WHO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의존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인구 5명중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발표했다.
미디어로 인해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개인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학생 시절부터 우표수집, 일정 메모, 신문이나 잡지에서 작은 삽화를 오려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가 홍보물 제작회사여서 디자인팀이 주로 사용하는 상표나, 아이콘, 일러스트이미지 등을 수집했다.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 때도 그런 삽화나 신문 스크랩들을 애용했었다. 파일이나 대학노트에 가득 붙여 미국에 유학을 갈 때도 이삿짐에 넣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열어본 컴퓨터를 보고 놀라게 되었다. 그동안 엄청나게 모았다고 자랑했던 이미지들이 조그만 플로피 디스크 안에 색인까지 넣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내가 개인 컴퓨터를 처음 본 것은 80년대 초반, 제주도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의무장교의 책상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후로부터 10년이 못되어 한국 사회에도 개인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퍼스널 컴퓨터의 출현은 세상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말하자면, 미디어 빅뱅(Media Big Bang) 시대를 누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의 발전과 맞물려 이제는 멀티미디어들이 활개를 치고 전 문화를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선, 광선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네트워크 사회를 경험하기도 했다. 교회 역시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정보화 작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는 모든 교회들의
사역에서 미디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문화 변동이 정치나 경제, 교육, 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급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예배 문화일 것으로 보인다. 예배의 본질은 그대로 존재하나 앞으로 예배 양식이나 형식들은 바뀔 것이라는 데는 누구든지 동의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여기고 영상예배를 드리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신학적이고 예배학적 점검이 꼭 필요할 것이다.
‘영상예배’ 혹은 ‘영상설교’라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영상매체 활용이 신학적, 성경적 바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예배와 교육 갱신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미래의 예배에는 뉴 미디어의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뉴 미디어를 예배에 사용하는데 신학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제한점은 무엇인가 고려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문화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상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영상을 예배나 교육에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 성경적 기초와 역사적 검증, 그리고 현대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의 문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예배와 교육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영상- 코로나 시대의 예배가 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교회는 공식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력이 무척 높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급작스럽게 미디어를 통한 영상 예배를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송출하게 되었는데, 매체에 대한 이해나 영상 미학에 관한 이해 없이 예배와 설교를 무분별하게 송출하였다. 그것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에 비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모처럼 영상을 활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잘 만들어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회에서 윤성민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는 방송 예배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시청자와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일단, 방송의 서론 부분을 일반 예배와는 다르게 시청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했다. 교회의 내부 장식을 매체 미학적으로 촬영하여 설교 이외의 또 다른 신학적 의미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할 때에는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함께 사용해서 평신도들이 주중에도 성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방송 예배와 유튜브를 통한 예배도 교회의 책임감 있는 공익성을 생각하면서 시청자와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가 이런 사태를 막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현장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줌으로써 비 기독교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웃을 돕는 영상은 미국 교회에서도 경험한 바 있었는데, 비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에른스트 랑게의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회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증언과 삶으로 사회 안에서 복음의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방송예배는 이런 소통이 일어날 때 완성된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예배는 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대신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 예배를 송출해도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