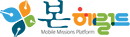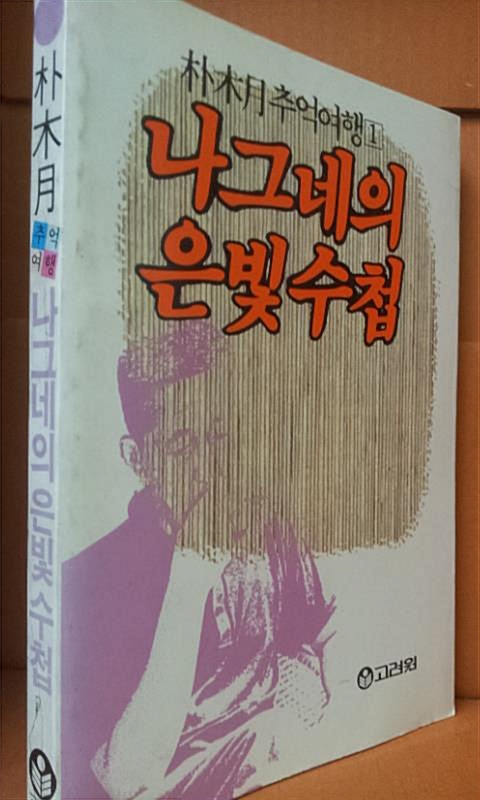
한성기 氏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한형.
지난 여름은 유성 온천(儒城溫泉)에서 형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즐거웠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문산(龍門山)에서 4, 5년 간의 기도 생활을 끝내고, 예산(禮山)에서 지방신문 지국 을 경영한다는 것은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성 온천에서 부인과 함께 조그만 가게를 벌이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 하였습니다.
형이 시단에 데뷔한 것은 사변 직후, 대전사범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무렵이라 기억됩니다. 처음으로 형의 작품을 대한 것이 열(列)이라는 것. 그것으로, 추천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후, 형의 작품을 간혹 지상에서 보아 왔으나, 원래 과작(寡作)인 형의 작품 활동이 활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부실하고 생활 형편도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도, 원인의 하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이유는 시보다 신앙 생활에 깊이 침잠한 탓일 것입니다. 그러던 형을 유성 온천에서 만나게 되고, 더구나 지난해 엮은 《落鄕以後》라는 시집을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날
복숭아 밭 전지剪枝를 했다.
누가 내다보고 있다.
한나절 싹둑거리는 소리.
바람이 덜렁거리는 날
우리는 이웃에 놀러 갔다.
그새 치워버린
오일 스토오브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빈자리를 본다.
기물器物은 치웠으나,
한동안 지워지지 않던 빈자리.
조용하고 따뜻한 날
복숭아 밭 전지를 했다.
복숭아 밭 가지 사이로
꽃잎같이 어른대는 사람의 모습.
그 시집에 수록된 〈三月〉이라는 형의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시집을 읽어 가다가 이 작품을 대하게 되자, 솔직하게 말하면 감동이라기보다는 경악이 앞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해 온 종교시(宗敎詩)라는 것이 교의(敎義)의 풀이나, 찬송가적인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작품은 의식의 밑바닥에 침투하여, 하느님의 것으로서의 세계 발견과 신에의 경외감, 죽음과의 대비적인 것으로 삶의 본질적인 숙연성 및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한형.
우리가 지니는 신앙을 본질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형화(成形化)된 신조도 아니며, 더구나 맹목적인 추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생활의 국면에서 미묘하게 현현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만이 실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신의 눈동자 안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인식 하며, 우리들의 삶의 의의가 그분의 뜻으로 영원하기를 희구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참으로 〈三月〉 둘째 연 첫 줄은 형의 오랜 신앙 생활에서 빚어진 가장 확고한 표현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굽어보는 신의 눈동자와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생명의 복숭아나무 곁가지를 전지할 수 있는 작업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형은 눈을 하늘로 치뜨고 신을 부르짖기보다는, 「한동안 지워지지 않던 빈자리를 응시함으로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고, 떠나는 것」과 「떠난 후의 일을 생각함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숙연성을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의 이 작품에서 내게 가장 놀라운 귀절은 종련의 마지막 행입니다. 그 귀절에서 보여 주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화목한 유대(紐帶)는 신앙가가 획득할 수 있는 엄청난 승리이기도 합니다.
한형.
그날 긴 개울둑을 함께 걸으면서 형이 한 말을 아직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와도 인물이 없 으면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진다. —이것이야말로 형의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으로서, 인간을 통한 신의 발견을 희구하는 형의 신앙이 〈三月〉의 마지막 줄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서간문 형식으로 쓰게 되는 나의 글이 덜 성숙된 것임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총망 중에 문책(文責)을 면하기 위하여 쓰게 되는 이 글에서 전혀 빗나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나그네의 은빛 수첩, 고려원, 1987, 247-250쪽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