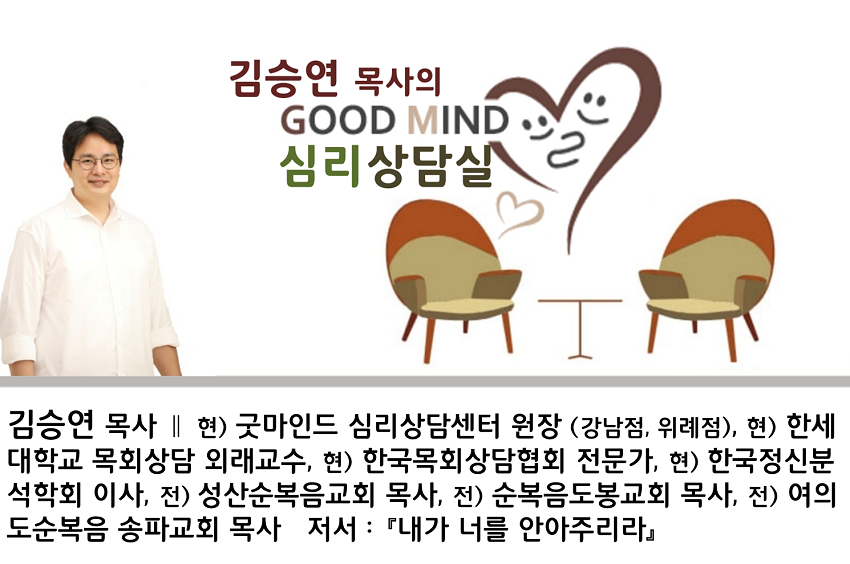
의학적으로 항상성을 의미하는 ‘호메오스타시스’의 변형된 개념인 ‘알로스타시스’라는 개념이 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뇌는 정상의 기준을 변화시켜 적응한다는 개념이다. 즉 인간은 무언가에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두려워한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지만,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노예처럼 조정을 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 등. 이런 정신세계에는 ‘알로스타시스’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아무리 힘든 대인관계라 하더라도 그 대인관계의 패턴을 벗어나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원인에는 뇌가 평소의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을 위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번 무의식적으로 패턴화 된 방식이 익숙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되면 익숙한 관계 방식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관계패턴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관계맺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알로스타시스’가 형성되면 좀처럼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야구선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만일 어떤 야구선수가 자신에게 익숙한 타격폼으로 경기를 했는데 경기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타격폼을 교정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타격폼을 교정 할 때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타격폼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을 교육해본 경험이 있고 객관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코치와 같은 제 삼자의 개입이다.
우리 대인관계의 패턴과 야구 타격폼을 연결 지어서 생각해보면 이렇다. 내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특졍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가리켜서 뇌 과학에서는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고, 스키마 치료에서는 ‘부적응적 반응’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굳어져 있는 관계적 패턴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적 조언과 함께 관계적인 재프로그램밍을 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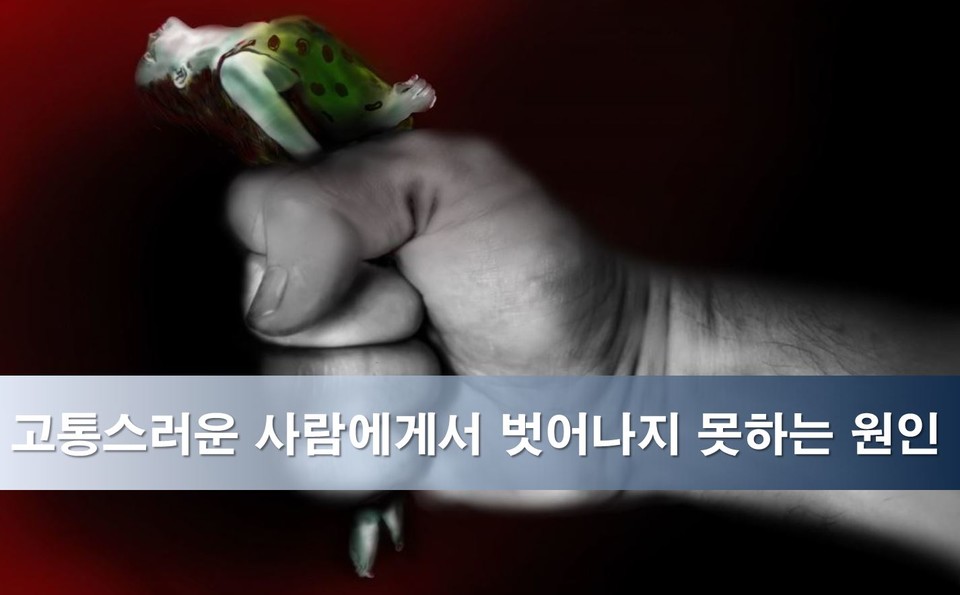
L씨는 유치원 원장이다. 젊은 나이에 원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을 정도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열정적인 여성이다. 게다가 이미지가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은 힘 있게 하고 있지만, L씨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거리가 있었다.
사실 L씨는 밤마다 매 맞는 아내다. 남편이 퇴근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포감에 괴로워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있어야만 그나마 안심된다고 한다.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이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그런 남편에게 익숙해진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관계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다.
L씨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자랐다. 일찍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했지만 어린 자신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아보지를 못 했다.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버림받고 감정을 챙김 받지 못해서인지 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은 고통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다른 감정은 모두 견딜 수 있지만, 혼자 된 기분은 고통 그 자체여서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두들겨 맞더라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녀의 마음에 잡혀져 있는 관계패턴을 알게 되었고, 내면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방식을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말한다. 또한 뇌과학적으로는 ‘절차기억’을 ‘삽화성 기억’과 ‘작업기억’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굳어진 관계적인 관성으로 인해 자동화된 패턴을 재프로그램밍을 하는 것이다.
L씨에게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독성관계’다.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도대체 자신이 왜 그런 남편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매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 답답하고 억울했던 마음이었다. 그러나 내적 재프로그램밍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각본’을 다시쓰기 시작했다. 인생각본을 다시 작성하면서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혼자될 것이 두려워서 매달리는 관계패턴에서 익숙했던 방식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익숙한 방식은 그냥 그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식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
불행한 관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우리는 나의 굳어진 관계패턴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처럼 우리는 늘 하던 방식 그대로 관계패턴을 유지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