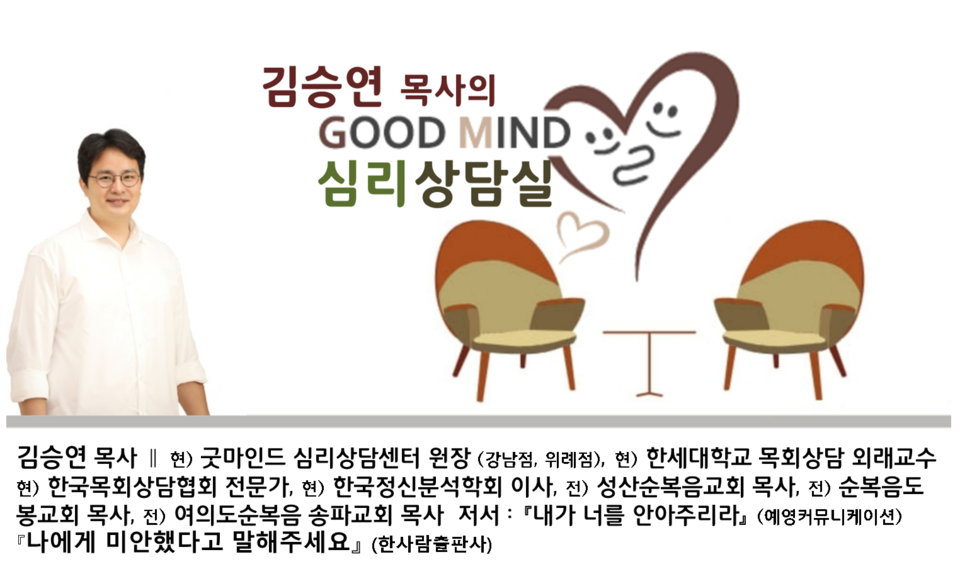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울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자신도 모르게 화를 참지 못해 욱하고 화를 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낄 때 몰려오는 괴로움 때문에 생활의 균형감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친구와 대화를 하다, 친구가 힘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힘든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30대 중반인 K씨는 4살짜리 딸이 있다. K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품이 좋다는 평이 많다. 감정적인 기복이 크지 않고 일관된 감정상태를 유지해서인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좋다. 가정생활에도 크게 느껴 질만한 문제도 없는 듯하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딸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평소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은 감정적인 기복이 크지 않고 성품도 온화한 편인데, 갑자기 욱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자신에게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말이다. 그래서인지 더욱 느껴지는 죄책감을 스스로 처리를 못하고 있다.

K씨의 아버지는 성품이 다혈질적이었다. K씨가 어릴 때 경험했던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아버지였지만, 한번 화가 나면 평소 알고 있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였다.
K씨가 어릴 때 부모님은 맞벌이셨다. 하루는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엄마 가지 마, 아빠 같이 놀자”라고 울면서 원하는 것을 표현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자신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었다. 돌변하셔서 “도대체 언제까지 울 거야”라고 소리를 치셨다.
그날 이후로 K씨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참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느껴지고 있는 고통스런 감정을 부모님께 수용 받으면서 고통스런 감정을 스스로 달랠 수 있는 자기 진정화를 습득하지 못 했다. 대신 고통스런 감정을 마음에서 초대하지 않기로 내적맹세를 했고, 그런 결과 힘들면 차라리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지내기로 작정했었다. 그런 내적맹세가 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K씨가 울고 있는 4살짜리 자신의 딸을 보고 욱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 고통스런 감정이 있었지만 수용 받지 못 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는 무의식적인 과정에 있게 된 것이다. 울고 있는 4살짜리 딸에게 욱하고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의식적인 과정이 있다. 고통스런 감정을 수용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내면능력이 약하다. 고통스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회피가 강해질수록 기쁨과 평정심을 누릴 수 있는 무의식적 과정이 약할 수밖에 없다.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힘든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원인도 이런 이유다.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은 본인도 힘든 감정을 누군가에게 수용 받지 못한 무의식적인 퇴행현상이다. 힘들어 하는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수용 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으로 수용 받지 못 했던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이 될 수 있다.
가끔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질문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답한다. 이게 정답이다.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은 더더욱 느낄 수 없다.
성숙된 사람은 느껴지는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감정에 담겨진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 감정은 무조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다. 물론 사탄의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감정을 무조건 사탄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억눌렸던 감정, 즉 고통스러움을 외면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외면했던 고통스러운 감정에서부터 함께 하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