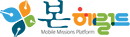한 생명체 그 궤적의 완성을 보여주고 떠남의 백미를 느끼게 해 주는 절기는 11월이다. 다시는 영영 오지 않으려는 듯 숙하게 떠나고 난 뒤의 가을 모습은 초연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서 게으른 걸음으로 소를 몰고 가는 촌로의 빈 공간이 겹치는 풍경들도 오직 11월에나 볼 수 있는 한국의 11월 모습이다.

11월 하면 어김없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대표적인 곡은 고엽(Les Feuilles Mortes)이다. 프랑스 샹송을 대변하는 불후의 명작으로 수많은 국가와 다양한 음악장르에서 편곡되어 이젠 원곡이 어떤 것인지 조차 분간키 어려울 정도로 가을 끝자락을 장식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원래는 1945년 사라 베르나르 극장에서 초연 되었던 롤랭 쁘띠의 발레 ‘량데부’를 위해서 만든 곡이지만 1946년 이브 몽땅(Yves Montand)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 밤의 문(Les Portes De La Nuit)에서 부르며 최고의 베스트 곡이 되었다. 사실 이 곡을 백 뮤직으로 한 영화 ‘밤의 문’(Les Portes De La Nuit)은 흥행이 처참할 정도로 실패했음에도 이 음악은 각인되어 크게 성공을 거둔 보기드믄 케이스다.

프랑스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자크 프레베르(Jacgues Prevert)가 가사를 붙인 고엽(Les Feuilles Mortes)은 막노동을 하며 시골 카페에서 노래하던 이브몽땅(Yves Montand)을 일약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 준 곡이다.
11월, 석간신문을 돌리고 지하의 다방계단을 오르면 어김없이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 소년기의 문화적 소양의 기틀은 내 가난한 삶 속에 늘 함께 했었다. 문학도 음악도 길거리에 붙은 광고물의 시각적 요소들도 내 서정문학의 바탕이 되어준 것이다. 제목을 알고 듣거나 연주하는 것을 모두 생략한 채 온전히 내 스스로 익숙해져 뉘 늦게 탄생배경과 유명해진 이유들을 알게 된 것이다.
고엽의 시작은
오, 내가 기억했으면 하는데, 우리 친구였던 그 행복했던 날들을 그 당시 삶은 아주 달콤했지
태양은 오늘보다 더 밝았고, 낙엽은 가을에 삽으로 쌓여지니 우리의 후회와 추억들 또한...
노래에 앞서 프랑스 특유의 캬라멜마끼야또 같은 달콤한 음색의 멘트가 이어지고 노래는 이어진다. 그런데, 북풍이 그들을 쓸어버리지 추운 망각의 밤 속으로...
이 곡을 듣다보면 알 수 없는 격정과 심연의 슬픔이 피어오른다. 노래의 가사도 의미도 모른 체 이 곡을 수없이 듣고 또 들었다. 정작 이 곡명을 알 수 있었던 건 군사정권을 피해 강원도 자작나무 동네에 은거했던 선배를 찾아가 며칠 머무는 동안 알 수 있었다. 선배를 찾아 온 운동권 출신 대학생 누나가 기타를 치며 고엽을 자주 불러주고, 노래에 대한 일화들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길에서나 카페 등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 익숙한데 정작 곡명을 모르는 것이 허다하다.

며칠 전 대전으로 가는 아침열차의 풍경들은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낯설어 애써 이곳은 어디쯤일까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밖을 바라보았다. 스치듯 지나가는 11월의 잔해들은 파도처럼 밀려다니며 먼 기억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아이는 제가 책임질 터이니 원하는 것을 다 해 보라”며 돈 2만 원을 손에 쥐어주던 아내의 얼굴이 반사된 창엔 쉼 없이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선배의 사업장에 보증을 서 주고 난 뒤 선배 회사가 부도가 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직장에도 압류가 들어와 쫓겨났었다. 지방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인 아내를 찾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만 보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던 때도 11월 중순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애써 태연한척 연무 가득한 냇가를 지난 기차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엽’ 노래를 스마트폰으로 듣는다.
삶의 진정성이 물질과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그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 치유의 방법은 음악을 통한 성찰이다. 특히 초록원색의 세상들이 순식간에 꿈을 표현하듯 온 색채로 장식하고 떠나고 비우는 이 절기야 말로 반성을 통한 치유의 시간들이다.
돌아보면 참 감사하게도 내겐 섭섭했던 기억과 누군가를 원망했던 순간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기억엔 감사함이 남아 있다. 내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라면 한 개로 허기를 채워주던 그 은혜들은 깊고 크게 다가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일들이 수없이 많다. 마음에 빚짐은 이토록 날로 커지는데, 그 갚을 방법은 무엇일지 곰곰 생각해 보는 요즘이다. 지금 고엽을 들으며 2023년의 가을연가를 소고로 남긴다.

글: 자명
●블루애플자산운용주식회사
●CEO/CIO(투자총책임자)
●The CJ Holdings LTD CEO
●M&A전문가(기업인수합병 및 평가)
●한국 문인협회 회원, 작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