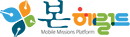가을걷이가 끝난 강원도 어느 산골의 11월 끝자락은 피안의 세계에 들어 온 듯 순례자들의 종착지였다. 손을 내밀면 바람이 잡힐 것만 같고 저 산등성을 넘으면 그리운 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발걸음은 이내 빨라지기 시작했다. 사각거리던 속닥거림도 연노랑 물결도 언제인 듯 사라지고 초연히 그네들끼리 서 있었다.
11월을 대표 하는 건 분명 자작이라고 단정했던 나는 마음이 조급해 지거나 휑해질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 은둔의 시간을 보냈다. 그다지 화려하지도 원색초록도 아닌 민낯 수수함으로 한여름을 보낸 그들은 쪽머리를 한 여인의 단아함으로 가을을 맞는다. 비에 젖은 나목자작을 보며 11월은 성찰의 시간,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절기라는 것도 그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숲에서 치유케 하는 피톤치드나 자연의 기운 등 임상적인 이로움을 제공해 주는 여러 나무들과 달리 자작나무는 영혼을 치유케 하는 초자연적 정령의 혼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군사정권시절 서슬이 시퍼런 형사들의 눈을 피해 찾아간 강원도 인재에서 자작나무들을 처음 만났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친구는 그물망 같은 감시망을 피해 용케도 그 곳으로 숨어 들었다. 은사시나무와 자작나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던 내게 친구는 언제인 듯 나무박사가 되어 자작들의 내면과 역사를 속속들이 설명해 주었다.
나보다 두 살 위인 그는 늘 말이 없었고 눈빛이 선했다. 의로운 일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심취해 있었던 경제학도였다. 일 년도 안 된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이 그를 자연과 동화되게 하였고 영적 충만의 자유를 얻게 했을까.
그와 함께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가졌던 그 수수께끼의 기억들이 새롭다. 몇 주일을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틈나면 자작나무 숲을 찾았다. 비가 내리거나 어스름한 시간이면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 놓은 순백의 초연함으로 나를 맞아주던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귀 기울여 주었다. 이젠 아득한 먼 거리에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내게 가장 친숙한 나무가 되었고 그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저 주기만 한 그 고마움이 얼마인지도 속속 알고 있다.

불을 지피면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라고 부르며 더러는 봇나무 또는 화피목이라고도 부른다. 북 러시아 대륙의 대표적인 수종이며 고도가 높고 추운 지방에서 자란다. 봄에 잎이나 11월 나목이 되기까지 여느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담갈색 옷으로 겨울을 보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본연의 색, 은백을 드러내 놓는다. 본연의 정체성을 한 번 드러내면 죽어서도 그 색은 변하지 않는 것도 그들만의 정체성이다.
석양이 유난히 낮고 붉어지는 11월 늦은 하오가 되면 친구는 숲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배기에 홀로 서 있는 자작에 기대어 하염없이 황혼을 바라보다 어둠에 묻힐 때가 잦았다. 그는 연일 뉴스마다 공개수배 된 주인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순례 길의 성자처럼 초연함으로 자작들과 동화되어 있었다.

자작은 북유럽에서 가장 신성시 되는 나무로 알려져 있고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로움을 주었다. 의학적으로 탁월한 성분을 지녀 여러 분야에서 치유의 원재료로 활용케 했는가 하면 중요한 먹거리 요소로 지금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또한 춥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기름기가 많아 불쏘시개의 대명사가 되었고, 껍데기는 얇고 질겨 종이 대신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천년도 훨씬 지난 천마총에 그려진 그림도 이 자작나무 껍데기에 그려진 것이고 팔만대장경의 일부 원판도 이 화피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화촉을 밝힌다고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자작나무 껍데기고 선비들이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도 이곳에 글씨는 새겼다.
우리나라 식품분야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한 껌도 설탕대신 이 나무들에서 추출한 자일리톨을 사용했기에 껌의 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속에 늘 가까이 오래전부터 함께 해 왔으면서도 자작나무에 대해 물으면 갸우뚱 하거나 은사시나무로 착각하기 일쑤다.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어딜 가나 계절에 관계없이 푸른 숲을 만난다. 에버그린 그 숲은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져 초록바다를 연출하고 있다. 11월 끝자락에 차를 달리다 보면 그 초록바다에 섬처럼 노란반점으로 집단을 이루고 있는 한 무리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자작나무 동네들이다. 곧고 단단하게 철옹성처럼 그들만의 영역을 지키며 다른 수종의 나무들이나 식물까지도 철저히 배제한 더글라스 침엽수들 그 무리 속에서 어떻게 저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켜 냈을까? 그 숭고함과 의연함에 경외감을 느낀다. 큰 고통이나 인내가 꼭 그 크기만큼 요구되지 않다는 것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신념의 의지 하나로도 거대함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자작나무 숲에서 찾는 작은 위로
살다보면 마음에 쌓인 무언가가 있어 번잡한 생각들로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공허감에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나 주관들이 상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리가 느껴지거나 작은 벽이 생겼다고 느낌이들 때면 자작나무 숲에 가보라. 숲이 아니라도 몇이 모여 있는 그들을 찾아가 그냥 서 있어보면 알 수 있을 터. 작고 소외되어 눈으로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해 소홀했던 내 주변과 이웃들이 큰 나무로 보일 수 있다. 작은 슬픔이나 비극을 위로해 주는 기쁨이나 확신을 갖는 계기는 사소한 진심과 새로운 눈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