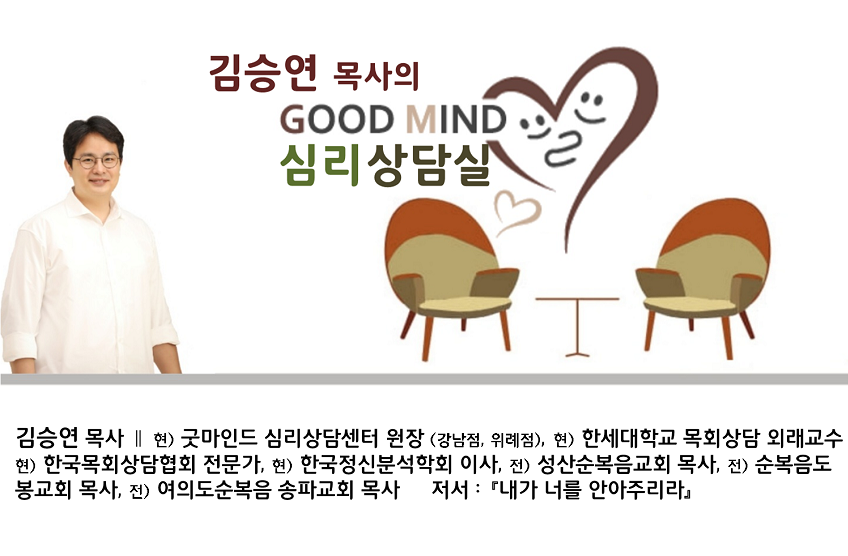
내담자: 5년 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믿지 못해 혼란스러워요.
상담사: 그렇군요. 무엇 때문에 남자친구를 믿지 못하시나요?
내담자: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를 믿지 못해서 그런 제가 더 한심스럽게 느껴져요. 그게 더 힘이 들어요. 도대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은 고통과 공포, 분노와 슬픔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 강렬하다. 가족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창피를 주고 놀리는 언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은 훗날 소중한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인생의 덫에 걸리게 된다.
요즘 학대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학대는 신체적인 영역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학대에는 신체적 영역뿐만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학대 등 넓은 개념으로까지 확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학대를 하는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은 경험대로 학대를 하는 것이다. 학대를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어릴 적에 경험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다. 어릴 때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경험을 하지 못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끼며 살 수 있겠는가.
마음에 안정감이 부족할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학대받은 경험은 너무 고통스럽고 강력하기 때문에 느끼고 싶지 않은 불편한 감정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버린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압할수록 반드시 어떤 강박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반복된다.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이런 반복적인 강박 행동을 가리켜서 ‘반복강박’이라고 했다. 강력한 반복강박은 자기파괴적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먼저 이별을 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허전한 마음을 어떤 중독적인 행위를 통해서 채우려는 마음, 많은 이성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행위 등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균형감이 떨어지는 반복적인 강박행동은 고통스러운 나의 감정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행동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누구에게나 반복강박적인 특징은 있다. 그러나 균형감 없이 정상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기파괴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감정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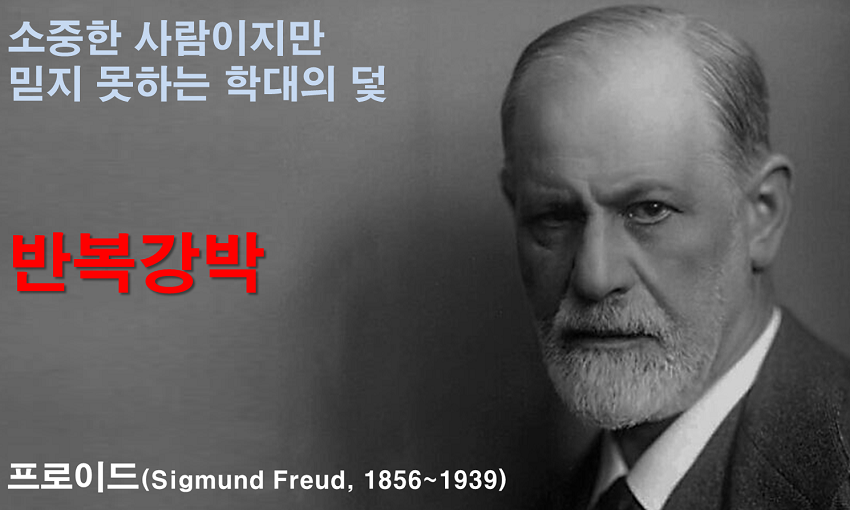
몇 년 전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문제로 30년 이상 오랫동안 기도해오셨다. 30년 동안 같은 문제로 힘들어 하셨으니 얼마나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여러모로 크셨을지 생각이 들었다. 심방을 부탁해서 심방을 갔었다. 그동안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격이 괴팍하고 덩치도 크실 분으로 상상을 했었다. 그런데 권사님의 남편을 만나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순한 양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권사님이 남편한테 대하시는 태도가 매우 비판적이셨다. 솔직히 말하면 구박을 하셨다.
중독은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반복강박에 속한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남편도 어머니의 부족한 사랑을 아내에게 채우려고 했었다. 인간은 부족한 욕구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권사님은 30년간 자신의 남편이 무엇 때문에 술을 찾는지 모르셨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서 남편분과 다 둘이서만 말씀하셨던 것이 오랫동안 기억된다.
“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용기를 내서 마음을 문을 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혼만 났어요. 이런 저는 어디로 가서 위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용기 내어서 마음을 열었던 아내에게 구박만 받았어요.”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기대를 채우지 않게 되면, 경직된 마음이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경직된 마음이 강해져서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수동적인 분노형태로 전환이 된다.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편안함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편안함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법이다. 남편 분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알코올이었던 것이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셨던 방식에는 공격적인 형태의 대화가 없으셨다. 그렇다고 변화를 강요하시지도 않으셨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주셨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 변화가 되었던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학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지 학대의 강도가 서로 다를 뿐이다. 학대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안정감이다. 영성이란, 안정감 있는 내면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나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 변하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을 외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지는 않으셨다.

